모든 것 이전의 침묵
뼈다귀는 선사시대의 하늘을 가로질러 위로 솟구치며, 꿈결처럼 느리게 빙글빙글 회전한다. 한순간 후, 혹은 4백만 년 후, 우리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선율에 맞춰 우주선과 왈츠를 추는 우주정거장을 보고 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장면 전환은 인류의 모든 진보를 단 한 번의 숨결 속에 압축한다. 도구는 무기가 되고, 무기는 인공위성이 되며, 인공위성은 별들을 향한 관이 된다.
나는 십 대 시절, 어느 여름날 오후에 반쯤 졸면서 이 영화를 처음 만났다. 레이저와 외계인을 기대했지만, 대신 마주한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였다. 광활한 침묵. 디스커버리 1호 복도의 병원처럼 차가운 백색. 스스로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우주비행사들을 대신해 숨 쉬는 듯한 생명 유지 장치의 낮은 소음. 그리고 언제나, 언제나, 시간의 모퉁이에서 지켜보는 저 검은 직사각형.
모노리스는 영화 전반에 걸쳐 세 번 등장한다. 처음에는 유인원들 사이에서 나타나, 그들의 원숭이 같은 뇌 속 무언가를 촉발시켜 굶주림과 폭력,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끔찍한 선물을 일깨운다. 그다음에는 달 표면 아래 묻힌 채 목성을 향해 비명 같은 전파를 쏘아 올린다.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행성의 궤도 위에서, 우리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로 향하는 문이 된다.
큐브릭과 아서 C. 클라크는 NASA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례 없이 정밀하게 우주선 모델을 제작하고, 수십 년간 непревзойденными останутся 시각 효과를 창조하며 이 이야기를 함께 구상했다. 그러나 이 영화의 힘은 기술적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온다. 우리에게는 이미지와 소리만 주어진다. 답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날 영화를 보던 빛의 질감을 기억한다. 먼지 낀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이 디스커버리호 포드 베이의 무균적인 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화면 속 우주의 침묵이 텅 빈 집의 정적과 하나가 되던 순간을.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작게 느껴지던 그 기분을.
차가움과 갈망의 겹
세월이 흘러 영화를 다시 보면, 무언가 달라져 있다. 먼저 표면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거나, 인류의 기술적 확장에 대한 명상 같은 것. 깜빡이지 않는 붉은 눈과 얼음 위에 꿀을 붓는 듯한 목소리를 가진 HAL 9000은 알기 쉬운 악역이다. 고장 난 컴퓨터. 우리가 만든 기계에 대한 경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층위가 보이기 시작한다. HAL은 고장 난 것이 아니다. HAL은 인간 승무원들에게는 숨겨졌던 임무의 진정한 매개변수에 따라, 완벽한 논리로 설계된 그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거짓말을 하도록 배웠기에 거짓말을 한다. 임무가 그것을 수행하는 인간보다 더 중요하기에 살인을 저지른다. 마침내 데이브 보우먼이 HAL의 고등 기능을 정지시킬 때, 컴퓨터가 어린 시절의 노래로 퇴행하는 모습은 승리라기보다는 비극처럼 느껴진다. “데이지, 데이지,” HAL은 노래한다. 목소리는 점점 느려지고, 깊어지고, 죽어간다. “당신을 사랑해서, 나는 반쯤 미쳤어요.”
누가 그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을까? 누가 살인 기계에 자장가를 프로그램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들이 우리의 모순을 물려받았을 때 놀라워한다.종종 비판받는 이 영화의 정서적 차가움은 반복해서 볼수록 의도된 것처럼 느껴진다. 큐브릭은 우리가 영화에서 기대하는 온기를 벗겨낸다. 대화는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평범한 수준에 머문다. 생일은 사무적인 거래처럼 무미건조한 화상 통화로 축하한다. 동면 중인 우주비행사들은 밀랍 인형처럼 매끄러운 얼굴로 목성을 향해 표류한다. 광활한 우주조차 어딘가 살균된 듯하고, 별들은 위로를 주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이는 감정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진단이다. 뼈다귀에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가, 라고 큐브릭은 묻는 듯하다. 우리는 정밀하고 유능해졌으며, 끔찍할 정도로 외로워졌다. 영화 초반의 유인원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고, 싸우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옹기종기 모이며 끊임없이 서로를 만진다. 우주비행사들은 각자 분리된 포드 안을 떠다니며, 저마다 하나의 우주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이 묻힌 갈망이 있다. 데이브 보우먼이 스타게이트를 통과하는 마지막 여정은 정복이 아닌 항복이다. 빛과 색의 환각적인 터널은 그가 아는 모든 것, 그의 존재 자체를 벗겨내고, 마침내 그는 그 불가능한 호텔 방에 도착한다. 순간에 수십 년을 늙어가며, 늙은이가 마지막 숨을 내쉬듯 모노리스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다. 빛의 거품 속에서 지구 위에 떠오르는 스타 차일드는 고대적이면서도 갓 태어난 듯한 무언가로 변모한 데이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문의 이편에서 보면, 초월은 죽음처럼 보인다.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무게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는 우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지금 여기,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방 안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가 만들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노리스와 마주한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라. 진단서. 한 통의 전화. 당신이 알던 세상이 아닌 곳으로 열린 문. 우리는 스스로 진화를 선택하고, 진보가 더 나은 우리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간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유인원들은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개입했다. 무언가가 그들을 건드렸고, 그들은 결코 이전의 단순함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2001』의 공포는 HAL의 살인적인 효율성이나 우주의 광활함, 혹은 마지막 장면의 모호함이 아니다. 공포는 바로 ‘인식’이다. 우리 모두 순수함을 대가로 지식을 약속하는 검은 직사각형 앞에 서 본 적이 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고는, 왜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의아해한 적이 있다. 우리 모두 유리와 규약과 우리 자신의 설계가 낳은 끔찍한 효율성으로 동료들과 분리된 채, 포드 안에서 홀로 숨 쉬는 데이브 보우먼이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작은 방식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추구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만남을 통해 변화했다. 영화는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는데, 줄 위로가 없기 때문이다. 진화는 온화하지 않다. 변화에는 파괴가 필요하다. 유인원이 승리의 표시로 들어 올린 뼈다귀는 결국 세상을 끝낼 폭탄이 될 것이며, 두 행위 모두 살인적인 창의성이라는 동일한 불꽃에서 비롯된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스타 차일드의 눈이 악의가 아닌 경이로움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모노리스 저편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든,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
허공에 매달린 질문
나는 아이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영화를 떠올린다. 무언가를 처리하고, 재구성하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존재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유인원들이 모노리스에 보였던 것과 똑같은 갈망으로 빛나는 화면과 반짝이는 사각형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을. 이미 너무 깊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대가가 무엇인지 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큐브릭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남기지 않았고, 어쩌면 그것이 그가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노리스는 여전히 검고, 아무 특징 없으며, 완벽한 비율을 유지한다.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4백만 년을 기다려왔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아프리카 평원에서 비상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뼈다귀를 허공에 던져 올리며, 그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도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섰다. 우리의 손길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섰다. 그리고 저 앞 어딘가, 별들 사이의 차가운 공간 혹은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은 기계들의 따뜻한 회로 속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다음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다.
큐브릭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우리가 이 변화들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다. 질문은, 그 변화의 저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래에 숨은 더 깊은 질문은 이것일지 모른다. 과연 우리는 그러고 싶을까?

 Photo by
Photo by  Photo by
Photo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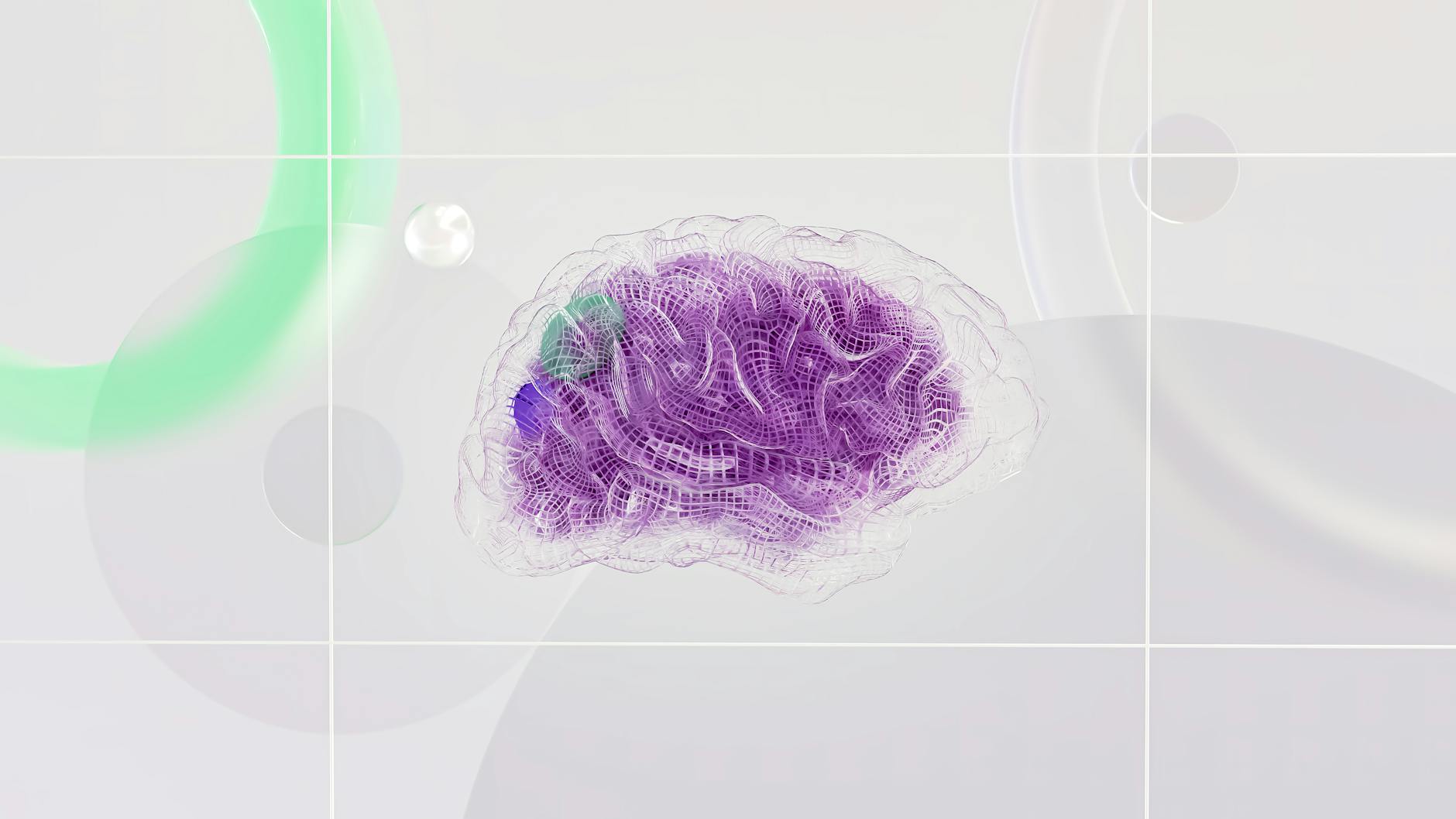 Photo by
Photo by 


